개취로 뽑은 2020년 15권의 책
아... 읽은 책도 없는데 어떻게 10권이나 꼽지,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쓰다 보면 꼭 10권이 넘어가게 되더라는. 이상하게 작년에도 막상 써보니 13권이었는데 이번에도 써 보니 15권이네요.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 리스트는 너무나 순수하게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1년에 책을 50권 100권씩 읽는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권위 없습니다.
물론 제게 <올해의 책>이 무슨 책인지는 너무나들 잘 아실 것이고^^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고 익사이팅한 책입니다. 읽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듯...
아무튼, 본격적인 리스트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 트랜스휴머니즘의 현재와 미래 /이브 해롤드

2020년의 드라마로 단연 탑이었던 <이어즈 앤 이어즈>를 보신 분들에겐 ‘트랜스휴먼’이란 말이 낯설지 않으실 듯. 작가가 미치오 가쿠의 책을 읽었는지 ‘육신의 제약을 딛고 하드디스크 안에 안주한 인간’이 트렌드가 되는 근미래를 묘사했다. 개인적으로 2020년의 은근한 화두는 ‘트랜스휴먼’이었던 듯. 그 의미를 참 읽기 쉽게 풀이한 책으로, 이 책을 읽고 <이어즈 앤 이어즈>와 아마존 드라마 <업로드>를 보시면 개념 정리 끝. 상상력이 뭉클뭉클.
여기 사람의 말이 있다 /구정은 이지선

헬렌 켈러는 우리가 알던 그런 가엾은 장애인 소녀가 아니었다. 메건 마클은 그냥 왕실을 시끄럽게 만든 제2의 사라 퍼거슨이 아니었다. 그리고 산드라는 인간 여성이 아니었다. 앙겔라 메르켈이 아직도 독일인의 반성과 전체주의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지금껏 말하고 있는 것은 ‘과거’라는 것의 청산이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작년에도 <사라진 버려진 남겨진>을 추천 리스트에 슬쩍 얹었는데, 구정은 ‘작가’의 시선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책값이라면 참 싸다.
위험한 생각들 /존 브록만 편

존 브록만이라는 놀라운 인맥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슈퍼 편집자(?)의 슈퍼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책. 근 100명의 석학들이 ‘당신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각자 ‘그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한 책이다. 예를 들어 진화심리학자 제프리 밀러는 “문명의 발달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지성체들은 아주 시시한 일들에만 관심을 갖는 ‘지적 나르시시즘’에 빠져 자멸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한 문명이 태어나 사라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채워진 책. 어찌 보면 ‘미친 책’ 일 수도, 어찌 보면 책 100권을 읽는 느낌일 수도. 2007년 책이지만 아직 흥미롭다.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

공부란 무엇인가 /김영민

사실 한 저자의 책을 두 권 넣고 싶지는 않았다. 사실 개인적인 느낌으로 두 책은 결국 똑 같은 주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공부란 무엇인가’가 표면적으로 ‘공부인(?)’의 자세를 다루고 있다면 앞의 책은 그 구체적인 예로 공자와 논어를 들고 있다. 공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체적 조명’이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결국 평생 잊을 수 없을 한 줄이 남았다. 道之不行, 已知之矣
공간이 만든 공간 /유현준

르 꼬르뷔지에 같은 대가들이 동양 건축의 요소를 원용했다, 이런 얘기는 여기저기서 듣곤 한다. 그런데 그게 대체 뭘까. 이 책에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통찰은 아무래도 '액자의 비유'다. 동양 건축에서 자연은 건축의 일부가 되고, 안방에 누워서도 장지문을 열면 앞산 뒷산이 눈에 들어온다. 그럼 처마는 액자의 역할을 하고, 처마 안쪽의 단청은 그 자연을 바라보는 액자의 장식 역할을 한다는 얘기. 이런 인사이트는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비밀의 계절 /도나 타트

어느 대학도시. 도대체 현실에서 쓸모라곤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리스 고전 문학에 심취해 고전 교수를 스승으로 모시는 폐쇄적인 학생 동아리. 그리고 그들 사이에선 서로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오고 가고, 마침내 그 결과는 비극으로 이어지지만 아직 끝은 멀었다. 밀접한 사람들 사이의 애정과 갈등 묘사는 러셀 웨스트브룩의 드리블 솜씨를 연상시킨다. 긴 소설이지만 책장이 엄청나게 빨리 넘어가는 책.
요리본능 /리처드 랭엄

원제는 Catching Fire. 인류학자가 음식에 주목해 온 것은 마빈 해리스 이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랭엄은 매우 좁은 주제, 즉 ‘불의 사용’에 초점을 맞춘다. 찰스 다윈도 ‘언어를 제외하면 아마도 인간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했다지 않는가. 불로 익힌 음식을 먹은 것이 문명의 발달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는 다들 어렴풋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냈을지에 대해 이렇게 깊이있게 추적한 사람은 많지 않을 듯. 참고로 침팬지도 구운 고기와 날고기 중에서 구운 고기를 더 좋아한다고 한다. 염감이 흘러 넘치지 않는가?
플로리다 /로런 그로프

개인적으로 2020년의 소설. ‘플로리다’라는 말 속에 깃든 낭만적인 태양, 긴 해변, 레게 뮤직과 모히또, 디즈니 월드 같은 이미지를 싹 날려 버릴 수 있는 단편집. 굉장히 좋았던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도 그랬듯 ‘플로리다’는 어쩐지 ‘낙원 같지만 한꺼풀 들추면 전혀 다른 곳’ 이라는 비유로 쓰이는 느낌이다. 이 단편집 속의 플로리다는 파충류들이 또아리를 틀고, 태풍이 불고, 진흙과 모래 틈으로 발이 빠지고, 야생 표범이 밀림 속에서 눈을 빛내는 곳이다. 가장 치열한 삶의 공간이다. 여러 단편 중에서도 뱀과 파충류 사이에서 감정을 잃고 성장한 한 소년 이야기, <둥근 지구, 그 가상의 공간에서 At the round earth's imagined corners> 가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김지은입니다 /김지은

내용상으로는 잘 짜여진 책이 아니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하나의 주제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풀고 있지도 못하다. 하지만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참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해준’ 책이다. 특히 이 나라의 공적처럼 된 중년 남자로서 참 아무것도 모르고 쉽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책. ‘양복 옷 태가 망가질까봐 전화기는 비서가 휴대해야 하는’ 사람, KTX를 타도 자기 자리 앞에는 아무 것도 두지 않는 사람과 일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모시는 방법’에 대한 인수인계 리스트가 두 페이지나 되는 사람과 일한다는 것은 대체 어떤 노동일까. 생각이 많아지는 책.
나쁜짓들의 역사 /로버트 에반스

재미와 교양? ‘인간은 어떻게 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을까’ 등의 소재를 설득력있게 풀어 주는 책. 이런 식의 사소한(혹은 사소하지 않은) 악덕들이 인류의 문명을 보다 풍성하게 해주고, 때로 결정적인 발전을 이루게 했다는 내용의 책. 물론 대부분의 문명은 이런 사소한 악행보다는 보다 많은 인간으로부터 아주 많은 것을 착취하려는 본격적이고 거대한 악의에 의해 더 많이 발전했겠지만, 이런 식의 시선을 슬쩍 바라보는 것도 상당한 지적 포만감을 준다.
화이트호스 /강화길

2020년의 한국 소설. 2019년 박상영을 제외한 ‘요즘 잘 나가는 젊은 작가들’에게 많이 실망했던 터에 단편 <음복> 한 편을 읽고 ‘이야, 이 작가는 진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단편집 <화이트 호스>를 읽고 나니 이 작가의 본진은 고딕 소설. 사실 몇몇 작품들은 그냥 배경만 한국으로 옮겼을 뿐 그냥 서구의 낡은 성을 배경으로 한 인물과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느낌도 든다. 그런 자신의 본진에서 나와 ‘한국’과 화해하려는 첫 본격적 시도가 <음복> 아니었을까. 단편집을 읽고 나니 이 작가의 다음 행보가 점점 더 궁금해진다.
갈라테아 2.2 /

1990년대의 시선으로 인공지능을 상상했던 결과들은 여러 영화와 드라마로 나와 있다. 그걸 문학에 적용시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사실 이 소설의 리뷰를 썼다가 저장을 하지 않아 날려 먹은 적이 있다. 어찌 보면 영화 ‘Her’의 원작 같은 느낌. 물론 이 속도로 인공지능을 ‘교육’하다간 어느 세월에 교육이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고색창연하고 비장한 느낌에 스윽 빠져드는 기분도 나쁘지 않다.
P.S. 마지막 대사는 고전 영화 <메리 포핀스>에서 따 온 것.
일 잘 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박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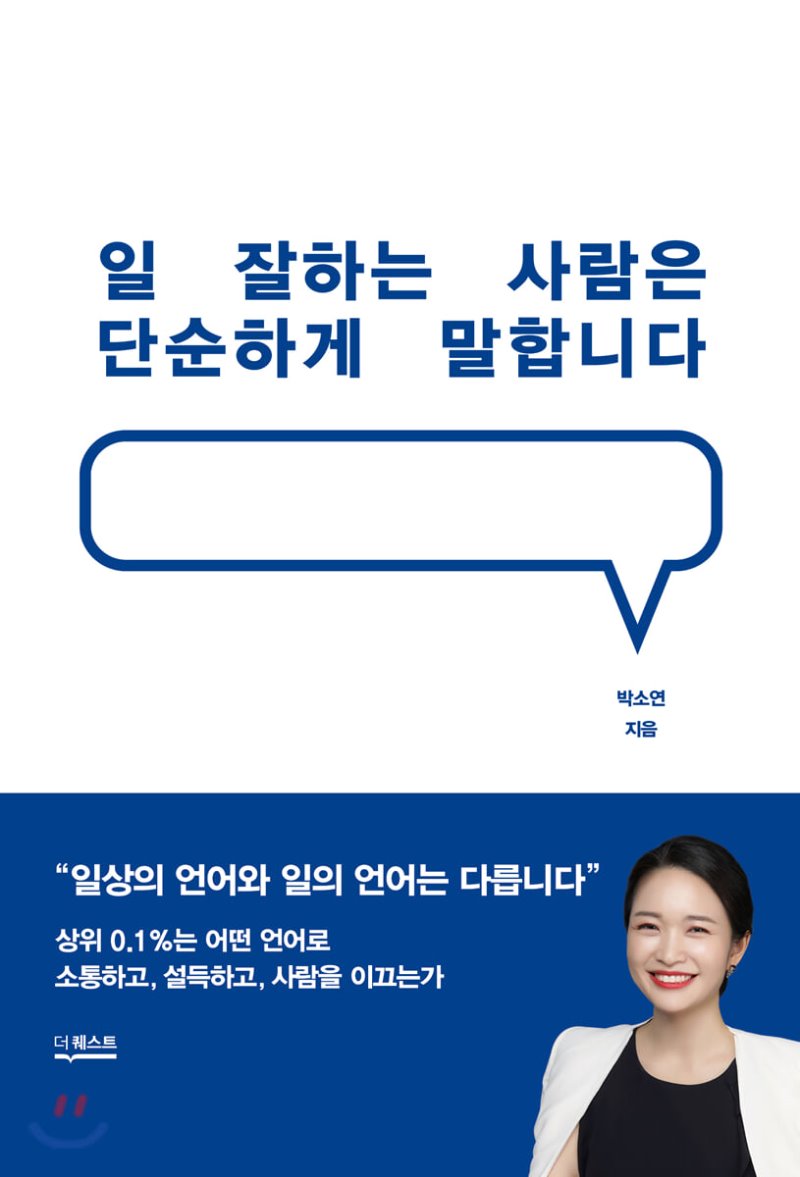
요즘 기업에서는 어떤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다 얻어 걸린 책. 정말 기업내/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이란 어떤 것인가를 간명하게 설명하는 책. 물론 현실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이 실려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읽어 두면 도움이 될 책. 특히 선배들이 내 말을 도무지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아 고민하는 젊은 사회인들이 읽으면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