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파리 06] 오랑주리, 수련만 보고 가지마

12월 6일.
여행 중반으로 접어든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미술관 투어가 시작된다. 4일짜리 뮤지엄 패스 첫날은 베르사유, 둘쨋날은 오랑주리와 오르세, 셋째날은 퐁피두, 넷째날은 루브르를 가기로 이미 작정을 해 놓고 있었다.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로댕 미술관이나 앵발리드의 나폴레옹 묘지 같은 곳도 가 볼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허약체질 부부의 컨디션을 볼 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뭐 인연이 닿으면 언젠가 파리를 또 올 수도 있겠지(과연?).
아무튼 미술관으로서의 첫 표적은 오랑주리 미술관. 오랑주리 Orangerie 는 글자 그대로 오렌지를 보관하던 창고라고. 모처럼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콩코르드 역에 내려서 세느강 쪽으로 몇발짝 걸어가면 저렇게 오벨리스크와 에펠탑이 겹쳐질 듯 보인다.

콩고르드 광장에서 오랑주리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묘하게 작은게 더 친근감이 간다.
창고라더니 온실... 하긴 뭐 온실이나 창고나.
아무튼 살짝 줄을 서야 했고(겨울인데!) 뮤지엄패스는 휴대 필수다. 짐을 맡기라고 해서 순순히 짐을 맡겼더라도, 뮤지엄패스는 반드시 따로 챙겨 놓고 있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잠시 소란을 겪고 입장.
사실 오랑주리 미술관은 루브르/오르세/퐁피두에 비해 규모 면에서는 많이 작다. 나도 오랑주리는 이번이 처음인데, 명성에 비해 너무 작아서 좀 놀랐을 정도. 그런데 유명한 이유가 있다.

입장하면 누구나 다 아는 모네의 방이 있다.

바로 그 모네가 그린 수백장의 연꽃 그림 중에서도 가장 큰, 대표적인 연꽃 그림.


그 거대한 수련 그림으로 긴 배 모양의 방을 휘감아 전시하고 있다.

어떻게 봐도 모네는 모네.
약 30년 전에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모네의 그림을 보고 '모네다!' 라고 감동했던 기억.
그런데 그 뒤로 전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여기도 모네가 있네'의 상태가 되었다. 대체 연꽃을 몇 점이나 그린 거야... 하루에 한장씩 몇년은 그린 듯한 이 연꽃의 물결.

하지만 이 연꽃들은 어쨌든 크고, 아름답다. 관광객들로 꽉 찬 방에서, 가능한 한 다른 관광객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진을 찍는게 매우 고난도의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잘 보면 그림이 조금 다르다. 모네의 방이 2개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랑주리 미술관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모네의 방 사진을 올려 놓고 있어서 매우 궁금했다. 대체 오랑주리의 나머지 공간에는 어떤 그림들이 있는 거지? 알고 보니 오랑주리 미술관은 꽤 작기는 하지만, 매우 알찬 컬렉션을 갖추고 있었다.
물론 모네의 방만 보고 휙 가버린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림들. 다른 작품들을 보려면 한 층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가장 먼저 방문객을 반기는 그림은 샘 프란시스 Sam Francis의 <In the blueness>. 1955년 작품으로, 모네의 수련 그림에서 영향을 받아 비슷한 풍으로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한다. 역시 모네가 지배하는 오랑주리.

이 사람이 누구인가보다, 이 그림을 그린게 누구인가가 사실 더 궁금한게 인지상정. 이 화가는 아메데오 모딜리아니다.
모딜리아니라고! 모딜리아니가 남자도 그렸단 말인가!

그림 속 남자는 폴 기욤 Paul Gillaume. 모딜리아니를 비롯한 많은 근대 화가들의 후원자였고, 죽은 뒤 자신의 컬렉션을 오랑주리 미술관에 기부했다. 그 공로로 이렇게 오랑주리의 지하 1층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모딜리아니의 그림 모델로도. 아무튼 당대의 풍류남에서 43세 요절까지... 전설이 되실 요소를 많이 갖춘 분이었다.

이건 모딜리아니가 그린 막스 야코프의 초상. 당시 시인이자 평론가로 명성을 날리던 야코프는 폴 기욤과 모딜리아니를 만나게 해 준 은인으로 꼽힌다. 어찌 보면 그 덕분에 오랑주리 미술관에 모딜리아니 상설관(폴 기욤의 컬렉션을 바탕으로 한)이 생긴 셈이다.

물론 모딜리아니가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 피카소, 마티스, 드렝, 수틴, 르누아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친 폭넓은 컬렉션이 대단하다.

샤임 수틴의 웨이터 그림 Le Garcon d'etage. 오래 전 미술 교과서에 나오던 수틴의 메신저 소년 그림도 떠오르고, 무엇보다 로알드 달의 단편 <피부>가 떠오른다. 어찌 어찌 하다가 수틴의 그림을 문신으로 몸에 간직하게 된 남자의 이야기.

수틴의 이런 풍경화는 낯설다.

해외의 대형 미술관을 보면 역시 교과서로 접하던 화가들의 낯선 그림들을 보게 된다. 앙리 루소의 그림 중에 밀림이 나오지 않는 그림은 처음 보는 것 같다. <폭풍우 속의 배 Le Navire dans la Tempete>. 일본 우키요에의 영향이 짙다고 하는데, 아마도 호쿠사이의 그림을 말하는 것은 아닐지.

루소의 또다른 작품,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 Promeneurs dans un parc>.

누가 뭐래도, 나뭇잎들만 봐도 역시 루소의 작품 맞다.

젊은 모리스 위트릴로가 그린 노틀담. 위트릴로가 그린 수많은 파리 풍경 중의 하나답게 화사함은 없고 쓸쓸함만 있다.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화가일 것으로' 추정되는 위트릴로.
어머니 수잔 발라동은 젊은 시절 르누아르, 로트렉을 비롯해 수많은 인상파 화가들의 모델이자 정부였던 것으로 유명하다. 나중에는 직접 화가로 데뷔하기도. 아무튼 위트릴로의 그림에서는 뭔가 예사롭지 않은 사연이 느껴지곤 한다.

앙리 마티스의 <푸른 오달리스크 Odalisque bleue>.

피에르 아우구스트 르누아르의 <긴 머리의 목욕하는 여인 Baigneuse aux cheveux longs>. 혹시 이 그림의 모델도 수잔 발라동은 아닌지.

그리고 오랑주리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인 앙드레 드렝의 <익살꾼과 피에로 Arlequin et Pierrot>. 왼쪽이 아를르켕, 오른쪽이 피에로다. 둘 다 '어릿광대'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뭐야 싶은데 아를르켕은 영어의 할리퀸 Harlequin 과 같은 것으로, 격자무늬 못이 특징이고, 꾀 많은 재담꾼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익숙한 피에로는 말 못하는 바보 캐릭터에 가깝다. 두 '광대'의 차이를 한 눈에 보여주는 교육자료(?)로서의 가치가 큰 그림이다.
누가 오랑주리의 느낌을 묻는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바글바글한 모네의 수련의 방과 한적하고 조용한 지하의 보물창고. 오랑주리에 가시는 분들은 부디 절대 모네의 방만 보고 휙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일이 없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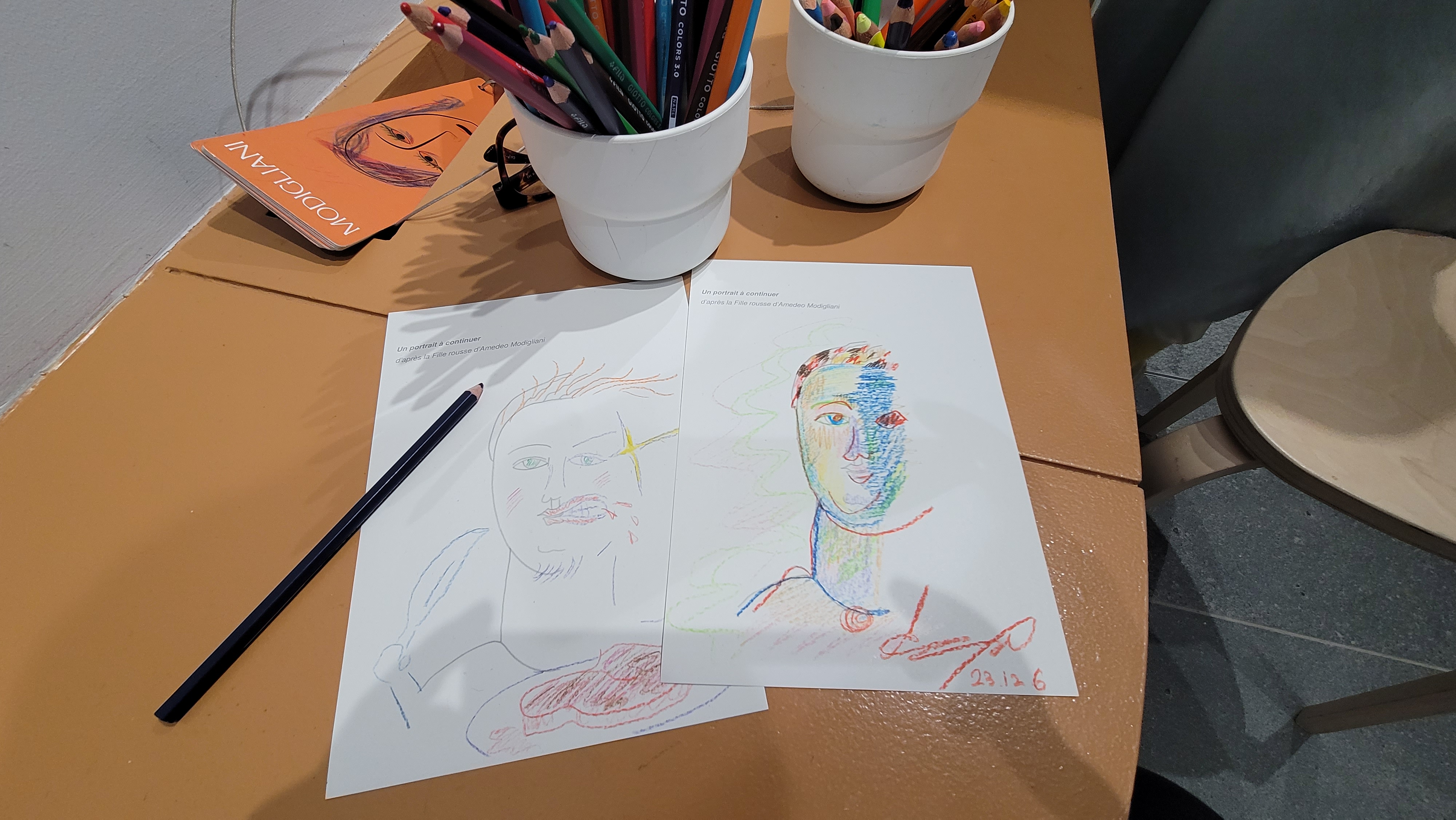
어쨌든 오랑주리를 보고 나오니 화창한 날씨가 기다리고 있다. 파리에 온 뒤로 가장 좋은 날씨.
오랑주리를 나와 남동쪽으로 600미터만 가면 오르세 미술관이 나온다. 사실 오르세 -루브르-오랑주리는 도보 이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리. 단 파리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 이 세 미술관을 하루에 다 '처리' 하겠다는 야심을 품으면 큰일난다. 평소 미술관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도 이런 미술관 3개를 하루에 돌면... 토한다.
아무래도 루브르에 하루를 할애하고 오랑주리와 오르세 까지는 하루에 묶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순서는 오랑주리-오르세 순으로. 오랑주리는 뮤지엄패스로 시간 예약이 가능하고, 오르세는 뮤지엄패스 전용 줄서기가 가능하지만 시간 예약은 따로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보다 오르세를 먼저 보고 나면 오랑주리는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역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세느강을 인도교로 건너면,

자 오르세!
25년만에 들어가 보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