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서에 맞춰 다시 올립니다.]
2023년 12월 파리를 방문하기로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숙소 알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연말로 예정된 공연들을 살펴보는 일이었다. 손꼽히는 대도시 파리에서 꼭 가 보고 싶은 공연장은 뭐니뭐니해도 '오페라'라는 지명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오페라 가르니에(영화든 뮤지컬이든, <오페라의 유령>을 보신 분이라면 '아 거기?'하실 바로 거기다), 그리고 라 빌레트에 새로 지어진 파리 필하모닉 홀이었다.
대부분의 공연 일정이 정해지는 것은 대략 6개월 전. 그런데 그로부터 한달 안에 중요한 공연들은 매진이 되어 버린다. 베를린 필하모닉 때도 그랬지만, 현장에 간 상태에서 '아, 베를린에 온 김에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이라도 한번 보러 갈까?'라고 생각하면 이미 늦다. 아주 운이 좋지 않으면 표를 구할 수 없다. 다만 일찍 표가 열린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기도 좀 불안한 것이, 한번 사고 나면 환불은 불가능(정말이다). 산 사람이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티켓을 파는게 최선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사야 한다.
2023년 12월, 가장 눈에 띄는 공연은 마리아 칼라스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이었는데, 이건 본 순간 이미 매진이었다. 실제로 티켓을 팔기는 했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오페라 가르니에 후원회원을 위한 특별 공연 같은 형식으로 관객들을 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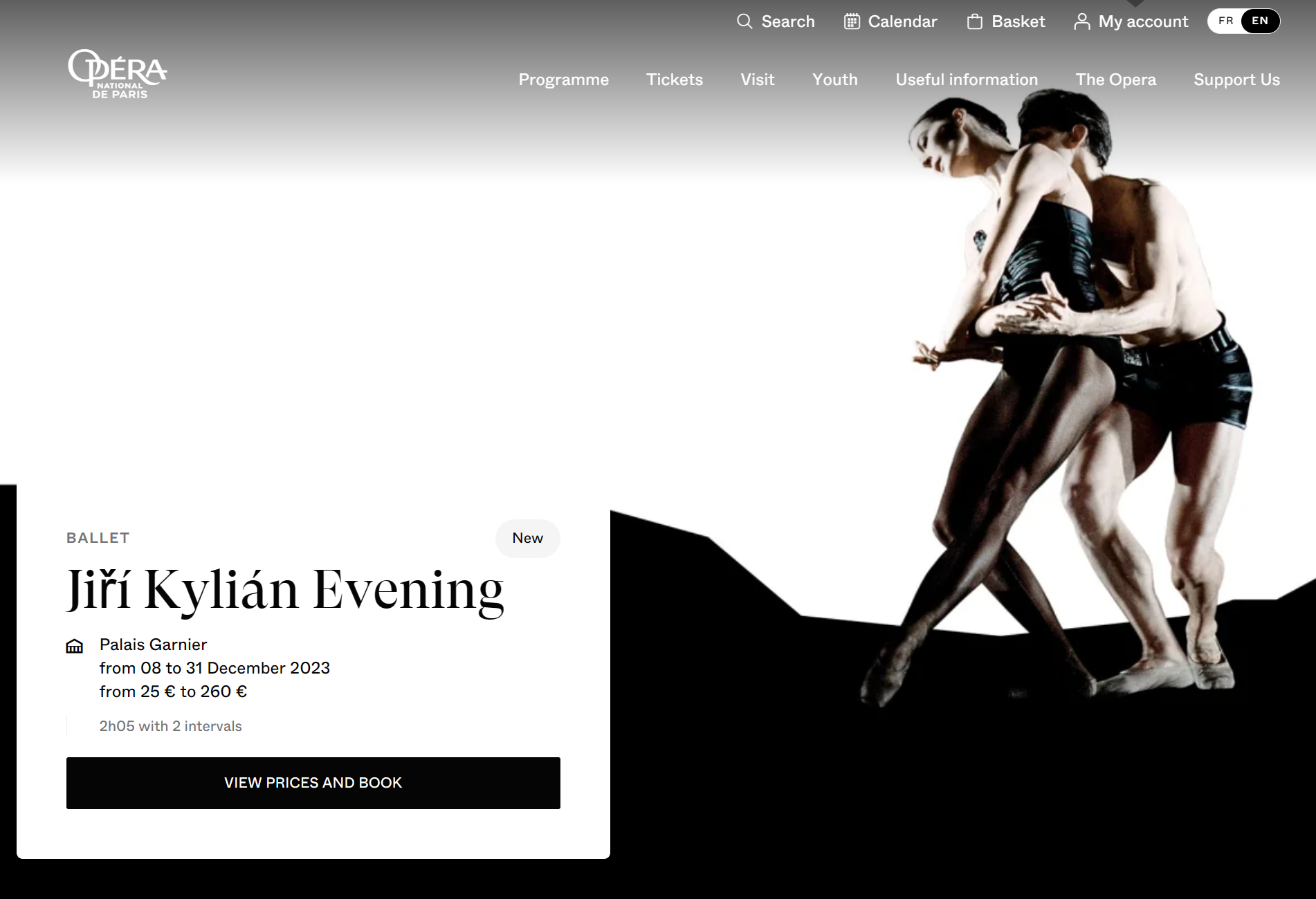
그 다음으로 꼽은 공연이 바로 이지 킬리앙 Jiri Kylian의 안무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 공연하는 <Jiri Kylian Evening> 공연. 흔히 지리 킬리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체코어로 Jiri라는 남자 이름은 '이지'라고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한다.
아무튼 네덜란드 발레 시어터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공연단체로 끌어올린 킬리안은 '현대 발레의 나침반'이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얻은 안무가(집에 그의 DVD를 두개 갖고 있다). 특히 강한 인상을 받은 <Petit Mort> 도 이번 공연 리스트에 들어 있는 걸 보고 이건 꼭 봐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공연장이 바로 오페라 가르니에. 사실 이름이 오페라지만 이미 오페라를 위한 공간으로선 수명을 다했다. 지금은 공연 프로그램의 90%가 발레. 오페라는 새로 지은 오페라 바스티유에서 거의 모두 소화된다. 혹자는 예쁘기만 한 공연장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발레 프로그램을 놓고 보면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였는데, 며칠 딴 생각을 하는 사이에 공연이 매진이 되어 버렸다. 이럴수가. 다행히 대기 모드를 띄워 놓고 기다린 결과, 약 한달 뒤에 빈 자리가 나왔다(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늦게 푸는 좌석이 있는 것인지). 바로 낚았는데, 사실 그리 좋은 자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19세기형 극장의 박스석이 어떤 분위기인지 맛볼 수 있었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는 수밖에.

어쨌든 공연 당일. 토요일 밤의 파리 오페라 주변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 날씨인데도 사람이 막 흘러다니는 분위기였다. 보수중이라 건물 앞부분은 차폐막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그 차폐막까지도 명품 광고... 그리고 극장 안으로 들어간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사진과 동영상을 보시면 느낌이 오실 듯.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이 극장을 처음 본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에 맡긴다. 2층과 3층의 회랑에서 바라보는 계단과 기둥의 장식들이 너무나 멋지다.
아마도 같은 유럽이라도 러시아나 발칸 제국 같은 변방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바로 파리와 다른 도시들을 구별하는 기준처럼 보였을 것 같다. 내게도 '알겠나? 이게 바로 문명이야'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아마 21세기의 사람들이라면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같은 건축물에서 느꼈을 그런.


그동안 멋진 걸 많이 봐 왔지만, 정말 눈이 휘둥그레진다. 더구나 이 멋진게 그냥 오래된 멋짐으로 남아 있는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극장이잖아. 그래서 더욱 대단한 것.
각각 다른 안내원에게 몇 차례 티켓을 보여주고 간신히 찾아간 곳은 무대 바로 앞의 2층 박스석. 묘한 구조라 1층과 2층의 구별이 모호하지만 어쨌든 박스석 중에는 가장 낮은 위치, 그러니까 무대와 거의 수평 위치에 있다.

박스석마다 입구가 있다.

저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박스 안에 한 6석 정도 좌석이 있다.

바로 건너편에 유명한 '유령의 박스'가 있다. 실제와는 무관하지만,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이후 저 자리를 찾는 관광객도 많다고 들었다. 물론 지금은 팬텀 아닌 일반 관객들이 그 자리에서 공연을 기다리고 있다.
머리를 들면 <오페라의 유령> 도입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샹들리에가 있고, 그 뒤에는 그 유명한... 샤갈이 그린 천정화가 있다. 사실 전날 퐁피두 센터에서 샤갈이 이 천정화를 그리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했던 스케치들을 보고 온 다음이라 감동이 더했다.

여기서 시선을 위로 올리면,

쿠궁.
그리고 공연.
맛보기로 하자면 이런 거다.
https://youtu.be/MKOqRvcLknE?feature=shared
뭐 말할 나위 없이 좋았다. <Gods and Dogs>, <Stepping Stones>, <Petit Mort>, <Sechs Tanze>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 고개를 너무 내밀고 보느라 목이 좀 아팠지만(무대에서 너무 가까운 박스석은 비추. 절대 비추. 더 가까운 박스석의 관객들은 대체 어떻게 공연을 봤는지 궁금하다), 무용수들의 안무 소화는 완벽했다. 드문드문 동양인 무용수가 보여 혹시 박세은...? 일까 했는데 그 뒤를 이어 파리 오페라 발레에 합류했다는 강호현이었다. 매우 훌륭했다.


물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공연을 마친 뒤 76세의 이지 킬리앙이 직접 무대에 오른 것. 20세기의 문화 영웅들이 하나씩 하나씩 흘러간 별들이 되고 있는 지금, 현대 발레의 이정표를 세운 거인을 직접 볼 수 있다니. 공연을 마치고 숙소로 걸어가는 동안, 절로 발길이 둥둥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사실 구경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객석 바깥쪽에는 쉬는 시간마다 음료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파티 공간이 있다.

근데 진심 호화롭기 그지없다.

지금의 눈으로 봐도 이런데, 19세기 사람들의 눈으로 봤다면 정말 이 공간이 어떻게 보였을지.
물론 전기의 도입 이후라야 제 역할을 했겠지만.


공연장, 좌석, 무대, 그 밖에 극장에서 펼쳐질 수 있는 파티를 위한 공간, 지금도 바로 쓰이고 있는 회랑 공간 등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파리 시민이냐, 관광객이냐의 차이는 이런 곳을 일상 공간처럼 향유하고, 저 자리에 여유있게 서서 칵테일이나 와인을 나누며 대화의 꽃을 피우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느껴질 정도.
물론 뭐니뭐니해도 극장의 완성은 무대.

낮시간에 오페라 가르니에 건물의 내부 투어를 하는 가격이 15유로. 블로그들을 보다 보면 내부 광경에 감탄해 '언젠가는 이 안에서 직접 공연을 보리라'는 평을 남긴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 다음에 파리에 가기로 되어 있는 분들, 방문 기간 중의 오페라 가르니에 공연 정보를 꼭 살펴 보시길. 그리고 반드시 공연을 보시길. 거기서 공연을 보고 그 안을 둘러본 느낌은 그동안 파리에서 했던 어떤 경험보다 값지고, 인상적이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턱시도를 입고,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가신다면 더 기막힌 경험이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그 안에 머무는 동안은 정말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 글을 읽고 그대로 하실 당신, 누구든 후회 없을 거라고 믿는다.
P.S. 파리 여행의 기록을 여기다 남기긴 남길 것인데, 한번에 다 숙제하듯 쓸 것도 아니고, 일단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을 포스팅으로 남깁니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아직 마음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파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전에도 그랬듯, 여행기는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곶감 뽑아 먹듯 올릴 예정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한번씩 들러 보시길.^^ [라고 썼고, 그래서 이 회차는 전체 여행기의 16회로 끼워넣습니다. 제 자리로.]
'여행을 하다가 > 파리 2023'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 파리 14] 크리스마스 때 파리를 가면 볼 수 있는 것 (1) | 2024.04.19 |
|---|---|
| [2023 파리 13] 루브르 보다 조엘 로부숑 먹방 (1) | 2024.04.14 |
| [2023 파리 12] 슈발 블랑,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레스토랑 (1) | 2024.04.10 |
| [2023 파리 11] '파리의 그분', 클라우스 메켈레 영접 (2) | 2024.04.07 |
| [2023 파리 10] 퐁피두 센터 4층은 샤갈의 영토 (0) | 2024.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