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벚꽃철에 교토에 간 적은 없었다. 단지 상상했을 뿐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세상을 화려하게 뒤덮다 강 위로 둥둥 떠내려가는 꽃잎을 노래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사라지는 벚꽃의 부질없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부질있다'는 말이 왜 없겠나. 부질없는 것은 그걸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강을 분홍색으로 메우고 떠내려가는 벚꽃 꽃잎을 볼 때 문득 '우키요에'라고 읽는, '浮世絵'의 한자가 떠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저러나, 이 포스팅은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세설>을 읽은 이야기다. 예전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대략 고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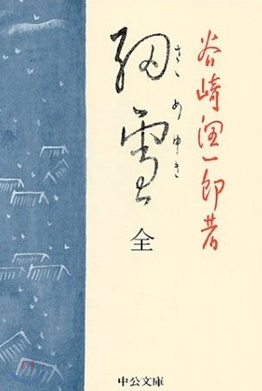
1. 일본에선 다니자키 준이치로가 몇년 더 살았으면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차례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한다. 다니자키는 1965년에 죽었고, 3년 뒤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
2. <설국> 대신 노벨상 수상작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세설>을 읽었다. 묘하게 둘 다 눈이다.

3. 1930년대, 고베의 몰락한 무사 가문의 네 딸들(실제로 등장인물의 역할을 하는것은 그중 세 딸)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각자의 삶을 가꾸어 가는 이야기다.
4. '가꾸어 간다'는 부분에서 뭐라 쓸까 잠시 망설였다. 그 자리에 개척한다든가 영위한다든가, 버틴다든가 이겨낸다든가, 다른 어떤 말을 넣어도 이 작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여인들은 그야말로 정교한 자수를 뜨듯, 화병에 꽃을 꽂듯 자기 삶을 꾸며간다, 는 느낌이 든다.
5. 다니자키가 이 작품을 쓰기 시작했을때(1943년)의 나이가 57세. 이 작품을 쓰려고 수십년간 여자들의 세계를 곁에서 관찰한 듯한 치열함에 감탄하게 된다. 대체 어떤 작가가 저 나이에 이 정도의 디테일이 살아 있는 여자들 이야기를 쓸수있단 말인가.

6. 바로 그 디테일의 재미가 기막히다. 간사이-간토의 묘한 자존심 싸움이랄까 하는 감정과 당시 풍물이 너무나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 그 시절의 일본에서 그럴듯한 집안들은 혼사를 앞두고 흥신소를 동원해 상대방의 레퍼런스체크를 거의 수사하듯 진행했다. 유전병, 전처의 사인, 전처 소생 아이의 성격까지 철저한 체크.
- 혼인 당사자가 얼굴을 보는 맞선 정도는 흔한 풍습이었다. 하지만 남자가 퇴짜를 놓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겨진 반면 어떤 이유를 대도 여자가 퇴짜를 놓는건 원한을 남겼다.
- 당시 일본에서는 이모와 언니를 가르는 촌수에 예민하지 않아 젊은 이모는 언니라고 부르기도 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다. [회사의 일본 직원에게 물어보니 요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한다.]
- 외래 문화에 민감한 고베 지역 상류층의 특징인지 모르지만 이미 이 시절에도 생선회와 화이트 와인을 곁들이는 건 매우 자연스러웠다. [고베는 지금도 이진칸이라는 20세기 초 외국인 거주 지역이 관광 명소로 남아 있을 정도로,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일찍부터 수행했다. 지금도 양과나 양식 요리의 수준이 높다고 일컬어진다.]
- 간사이에선 역시 도미. 참치는 상스러운 생선이라 해서 고급 스시야에선 취급하지 않았다. [기름진 참치, 특히 오도로를 맛있다고 먹기 시작한 것은 육고기의 지방을 받아들인 뒤의 일이라고 한다.]
...등등

7.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지금까지 최소 3회 이상 영화화됐다. 가장 유명한 것이 1983년판인데, 그 유명한 요시나가 사유리가 세째 유키코 역을 맡았다. 당시 38세. 아직 사진만 봤지만 '30대 초반인데 다들 20대로 보는 일본풍 미인' 유키코 역에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 1983년작은 구미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Makioka Sisters 라는 제목으로 꽤 매니악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전해진다. [네. 지금은 영화를 구해서 봤습니다.]

오른쪽부터 장녀 쓰루코 역의 기시 게이코, 차녀 사치코 역이 사쿠마 요시코, 3녀 유키코 역의 요시나가 사유, 4녀 타에코 역의 고테가와 유코. 셋째 역의 요시나가 사유리야 말할 것 없는 일본 영화의 전설이지만, 둘째 사치코 역을 맡은 사쿠마 요시코 (佐久間良子) 도 전 세대의 톱스타였다고 전해진다. 원작에도 셋째는 일본적인, 다소 수동적인 태도의 미인이지만 둘째는 활짝 피어난 미인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셋째의 맞선 자리에 "웬만하면 언니는 나가지 않는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

영화를 본 소감: 1983년작 <세설>은 물론 2권의 책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다는 부담 때문에 상당 부분을 덜어낸, 다소 다이제스트 판 같은 느낌의 작품이지만 그래도 화려한 기모노 패션과 당대 간사이 상류층의 분위기를 잘 살린 수작이라는 느낌. 캐스팅도 좋고 바로 그 '벚꽃 지는 시절 교토'의 풍광과 함께 사라진 시대의 미감이 훌륭하다.
그런데 각색에도 참여한 이치가와 곤 감독은 작품의 해석에서 상당히 큰 월권을 저지른다. 40년 전의 작품을 놓고 스포일러 타령을 하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결말을 알고 싶지 않은 분은 여기까지만.

영화판에서는 사치코의 남편, 그러니까 유키코의 형부와 유키코가 내연의 관계인 것으로 묘사된다. 영화 중간에 두 사람이 묘한 애정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우연히 사치코가 목격하지만 남편과 의 좋은 여동생의 관계를 자신이 오해(?) 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큰 죄라고 느끼는 듯 덮어 버린다. 그리고 마침내 노처녀 유키코가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자 형부는 혼자 요리집에서 술을 시켜 마시며 처제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을 흘린다.
원작에서 그런 뉘앙스를 굳이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겠으나, 영화처럼 노골적으로 두 사람의 감정을 묘사한 부분은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혹시 발견하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길). 이건 좀 너무한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이 정도는 각색자의 권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뭘 좀 하다가 > 책도 좀 보다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취로 뽑아본 2025년 10권의 책 (1) | 2025.12.30 |
|---|---|
| 개취로 뽑아본 2024년 10권의 책 (3) | 2024.12.29 |
| 패배의 신호, 서늘한 섬세함을 즐기려면. (19) | 2024.06.02 |
| AI와 인간, 부모-자식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 (0) | 2024.02.15 |
| 개취로 뽑아본 2023년 10권의 책 (16) | 2023.12.30 |